아무 증상 없다가 ‘한 번에’ 무너진다... 지금 준비해야 할 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약 132만 명. 이 중 대부분이 50세 이상이며,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은 가파르게 높아진다.
◇뼈가 약해지면, 삶도 무너진다
골다공증은 뼈가 점점 약해지면서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가 된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특히 척추, 손목, 고관절은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여성은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 손실이 빠르게 진행된다. 남성은 발병 시기는 늦지만 골절 시 사망률과 재골절률이 더 높다”고 말했다.
가장 위험한 건 고관절 골절이다. 수술 후 회복이 길고, 움직임이 제한되며, 고령자의 경우 사망률이 1년 내 15~20%에 이른다. 척추 골절은 허리가 굽고, 만성 통증이 이어지며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된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 키가 4cm 이상 줄었거나, 가벼운 낙상에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면 이미 골밀도가 많이 감소했을 수 있다.
진단은 골밀도 검사로 이뤄지며, 수치가 T점수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다. 그러나 골절 경험이나 위험 인자가 있다면, 수치가 높아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료는 약물요법이 중심이다. 뼈 흡수를 막거나, 뼈 생성을 촉진하는 약을 사용한다. 데노수맙, 비스포스포네이트, 호르몬 요법, 선택적 에스트로겐 조절제 등이 있다. 일부 약물은 중단 시 골절 위험이 더 커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해야 골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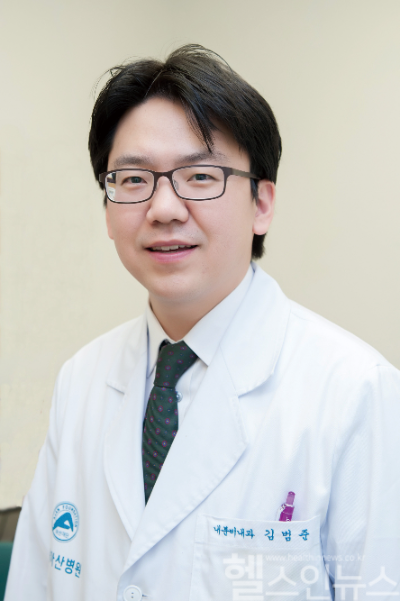
뼈 건강은 식습관, 운동, 환경 관리에서 출발한다.
첫째, 영양 관리. 칼슘은 하루 1000~1200mg, 비타민 D는 햇볕과 보충제로 보완한다. 멸치, 유제품, 두부, 해조류 등이 좋다. 반대로 짠 음식, 카페인, 술, 탄산음료, 가공식품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줄여야 한다.
둘째, 운동.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줄넘기 등 체중 부하 운동이 효과적이다. 주 4~5회, 하루 30분 이상이 권장된다.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단, 척추에 무리가 가는 윗몸일으키기, 무거운 중량 운동은 피하는 게 좋다.
셋째, 낙상 예방 환경 만들기. 집 안은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욕실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한다. 문턱 제거, 헐거운 카펫 정리 등도 기본이다.
김 교수는 “폐경 여성, 70세 이상 남성, 골절 병력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조기 진단이 골절을 막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골다공증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결과다. 보이지 않는 뼈의 상태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 골절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바로 뼈 건강을 챙기는 것이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임혜정 기자
press@healthinnews.kr


